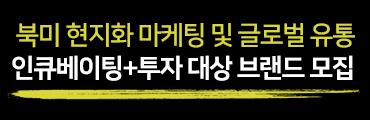평소 감자탕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신대리는 뒷 골목 감자탕집을 항상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지, 문을 열고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부랴부랴 서둘러 나왔지만, 이른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감자탕집은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었다. 신대리는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들어서자 마자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면서 일부러 사람을 찾는다는 듯이 크게 두리번거렸다. 바로 그 때 기둥 옆 모퉁이에서 신대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신대리님, 여깁니다.”
신대리는 무의식적으로 소리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며 인사를 하였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그는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아는지 조차 궁금하였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마케팅부에 온 신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에 약간은 미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신대리는 조심스럽게 인사하였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장개발팀의 박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우리 쪽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포장개발팀의 김대리, 심대리이시고, 그리고 이쪽은 자재팀의 박대리이십니다.”
박과장은 직장생활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긴 머리를 정돈되지 않게 뒤로 넘겼으며, 구겨진 흰색 와이셔츠를 검은색 면바지에 억지로 쑤셔 넣고 멜빵을 걸친 모습이 대번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임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다. 더욱이 얼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입으로 활짝 웃을 때마다 보이는 불규칙하게 벌어진 치아의 모습이 마치 만화책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희화적으로 보였는데, 그 큰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대를 초월한 도인처럼 고어 풍의 말투로 언뜻 겉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허술하게 생긴 것과는 달리 현재 회사에서 모든 제품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엔지니어이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인사를 막 마쳤을 때 좀 전에 신대리를 찾아왔던 이대리가 마치 춥다는 듯이 손을 비비며 들어왔다.
“에~또~ 자재팀 이대리님은 이미 만나셨을 테고…. 이제 다 오셨으니 우리 일단 소주 한잔부터 하십시다, 그려~.”
박과장은 특유의 풍류스런 말투로 건배를 제창하며 잔을 들었다. 신대리도 얼른 여러 사람들의 잔과 잔을 마주치며 소주 한잔을 단숨에 비웠다. 빈 속에 들어간 소주가 위를 짜릿하게 자극하자 모두들 입에서는 ‘크~’하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한잔씩 잔을 비우고 재차 잔이 채워지자, 신대리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대리는 하고 싶은 말을 망설이는 것처럼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한 분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셨는지….”
“아, 그건 말이죠….” 여지없이 박과장이 능청스러운 말투로 응대했다.
“신대리님야 우릴 잘 모르시겠지만, 신대리님께서는 우리 자재, 개발팀에서 그래도 꽤 유명하답니다. 마케팅에 어느 누가 있어, 그렇게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경영진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년에 신대리님께서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도 그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준 것 같아 매우 속 시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덕분에 눈에 가시 같았던 김상무도 날라가고 말이여~ 허허~”
여러 사람들이 박과장의 말에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랬군요. 아무튼 제게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한 잔 더 하시죠.”
- 계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