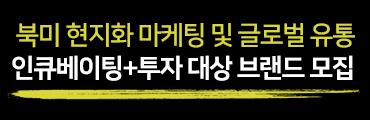증권사의 올해 3분기 화장품 대기업의 예상 실적 수치를 보는 순간 기자는 아찔한 현기증(Vertigo)을 느꼈다. 실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업계의 쓴소리들을 기억해냈다.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에는 K뷰티의 현주소를 일깨워주는 내용이 많았다.
“K뷰티가 잘 나가는 이유는 K팝이나 K드라마 등 한류 덕분이다. 일부 대업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물건이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쿠션 이후 K-뷰티 화장품 가운데 이렇다할 신기술이 나오지 않는다. 신생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더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 중국 빼고는 아모레퍼시픽보다 낫다.”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아 면세점 매출이 반토막 났다. 명동은 파리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중국인 관광객 그림자도 없다. 면세점 매출은 싼커의 대리구매나 웨이상 통해 겨우 메우는 수준이다.”
“색조화장품 C업체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대리점마다 난리다. 해지계약도 안해준다.”

“사드가 최소 1년은 더 갈 것이다. 중국이 호락호락한가. 사드 때문이 아니더라도 업체들의 옥석을 가릴 시점이 됐다. 사드라는 핑계로 경쟁력 없는 중국 진출 기업이 정리될 것이다.”
“현재 화장품 판매제조업체, 화장품제조업체가 1만개를 돌파했다. 세계 1위 시장인 미국도 4천개 수준인데 과열이다. 출발점은 틀리더라도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다. 1인 기업도 숱하다. 차제에 화장품 진입장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지만 대략 초점은 ‘심각한 매출 부진’으로 모아진다. 2분기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 추락이 3분기에 들어서면서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업계의 팍팍함은 더하다. 브랜드사의 매출 하락은 ODM업체의 일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원료사들도 덩달아 매출 부진에 전전긍긍이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쿵쿵 소리가 울리는 건설현장은 대부분 화장품 ODM공장의 신축‧증축 현장인데 완공도 되기 전에 ‘거래처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식약처는 2016년 화장품 실적 발표에서 “식약처의 합리적 규제 개선 및 수출 지원 정책이 성장폭 키웠다”고 자찬했다. 국내 화장품이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는 동시에 화장품 원료에 대해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2년(11.54%, 71,227억원)→ 2013년(11.92%, 79,720억원)→ 2014년(12.52%, 89,704억원)→2015년(19.65%, 107,328억원)→2016년(21.60%, 130,514억원)의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작년은 사상 최초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20%를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 2, 3분기 매출 추락은 '중국 특수'에 가려진 향후 K-뷰티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는 제자리를 유지하고 J-뷰티의 귀환이 K-뷰티의 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K-뷰티의 작년 실적이 허수처럼 보이고 현기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만난 대기업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다. 대기업은 자금력으로 버틴다지만 중소기업이나 신규 진입 기업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사드 탓으로 충격이 크지만 화장품의 고성장세가 마냥 이어지기 어려운 게 현실 아닌가. K뷰티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23개 상장사의 연구개발비 지출은 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규모별로 비교하면 대기업 8개사 0.1%, 중소기업 15개사 10.3%, 벤처기업 7개사 19.3%였다.
품질력과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가진 글로벌 브랜드는 정치 리스크 타격에도 회복력이 빠르다. 중국 시장에서 J-뷰티의 귀환은 K-뷰티만의 브랜드 파워가 그만큼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중국 로컬브랜드의 추격이 발밑까지 닥친 상태에서 위기감은 강하다. 지난 5년의 중국 특수에 가려진 K-뷰티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