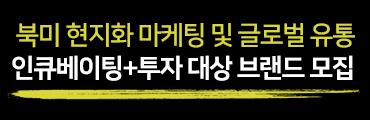20여 년 전 화장품업계에 첫 발을 들였을 때는 지금과 같은 K-뷰티의 성공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 매장인 프랑스 세포라와 독일 더글라스, 일본 로프트, 중국 왓슨, 홍콩 사사 등에서 한국산 제품을 간단히 찾아 볼 수 있어 화장품 업계 종사자로써 큰 기쁨을 느낀다.
20여 년 전 화장품업계에 첫 발을 들였을 때는 지금과 같은 K-뷰티의 성공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전문 매장인 프랑스 세포라와 독일 더글라스, 일본 로프트, 중국 왓슨, 홍콩 사사 등에서 한국산 제품을 간단히 찾아 볼 수 있어 화장품 업계 종사자로써 큰 기쁨을 느낀다.한국 화장품의 해외수출액은 2017년 49억5000만 달러(한화 약 5조 5,900억원)를 기록했고, 올해에는 10월까지 57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 4조원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5대 유망소비재 품목으로 정부 수출통계에 잡히는 등 수출효자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장품 분야로만 볼 때 수출액 기준 세계 5위로, 글로벌 유통체인에서는 한국 브랜드사의 화장품 수입과 소싱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출액의 63%가 중국과 홍콩으로 편중된 현실을 감안하면 유럽과 미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다변화는 과제로 남아있다.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별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위생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럽 화장품인증(CPNP), 중국의 위생허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 국가별·지역별로 기준과 금액이 상이하다. 품목마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이니, 보통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통 품목 수(SKU)가 100여 개인 것을 가만하면 허가비용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차를 통한 위생허가 취득 기간도 한 달 이내에서 1년여 소요된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의 80%는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앞서 말한 까다로운 허가 기준을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엔 벅차다. 허가기준의 이해를 위한 교육과 지원정책의 확대가 중소 수출기업에겐 매우 절실한 문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업체별 수출 지원금액 설정과 수입허가 취득 후 해당국가의 수출금액 증감을 보고 및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한다면 공정한 지원체계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 하나의 수출 애로사항은 '화장품 제조원 표기 의무'다. 제품의 콘셉트와 성분, 마케팅 소구, 제품라인 구성 등 제조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의 협업에 산물인 화장품에 제조원이 표기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된다. 해외에서 중소기업 브랜드의 판매력이 검증된 제품들을 해외 유통체인점들이 자체브랜드(PB)로 대체하는 게 현실이다. 제품 관련 비밀정보를 우리 스스로 공개함으로써 중소기업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나아가 브랜드사가 뚫고 제조사가 밀어주는 협업 체제가 위협받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표기하지 않는데 비춰, 우리나라의 이런 규정은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나 진배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K-뷰티의 대표 제품인 마스크팩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포라, 더글라스 등 매장에서 한국산 브랜드의 다양한 마스크팩 제품이 코리아 코스메틱 존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유럽 출장길에서 보니 세포라 익스클루시브 존으로 바뀌어 있었다. 한국산 제품이 세포라 PB로 둔갑한 것이다.
K-뷰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시장을 뚫기 위한 중소기업의 피땀 어린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화장품법의 '제조업자 표기 의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