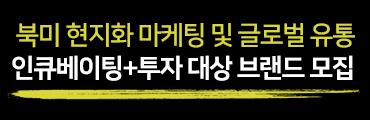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내 물건 팔아야 하는데... 허탈하다. 이건 아니다 싶다. 수출하려면 브랜딩과 마케팅이 중요하다. 올핸 신제품을 내놓고 새롭게 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A사는 잘 나가던 브랜드사다. 그러나 해외 수입사가 재구매 보다 OEM을 요구해 이를 대행하다 보니, 수익성은 떨어지고 심부름에 지쳐간다는 고백이다. 내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누빌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들이 고전 중이다. 해외 수입 거래처가 상품을 수입하기보다 똑같은 레시피로 OEM을 요구하는 게 비일비재라고 한다. 기자가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구동성은 "제조원 표기 삭제, 언제 되는냐?"다.
B사는 매년 1만여 개를 싱가포르에 수출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물량이 뚝 끊겼다. 더 이상 수입하지 않고 자체 브랜드로 출시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그 제품은 한국 대형 ODM에서 만든 me-too 제품이다. 시장을 확인했으니 복제품을 자사 브랜드로 만든 거다. 게다가 해외 대형 유통사들은 한국 브랜드의 복제품을 자사 PB로 K-뷰티 매대를 삼키고 있다.
"내가 만든 화장품을 내 손으로 ODM 납품하는 기막힌 현실"에 수많은 화장품 중소기업들이 추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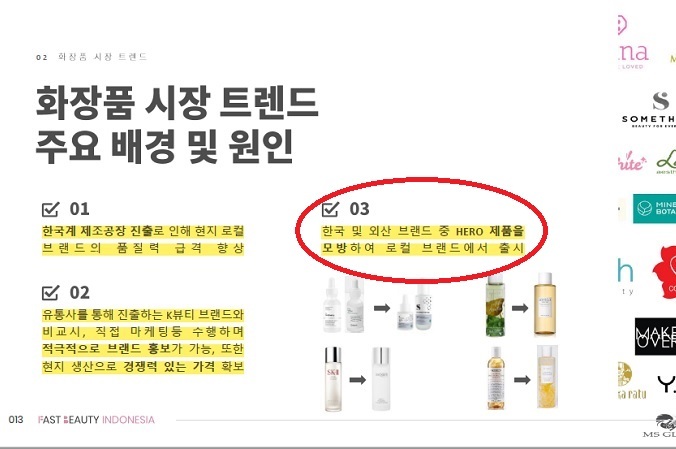
화장품업계는 ‘2등 전략’이 유행이다. 굳이 상품기획 한다고 고생할 것 없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에 살짝 콘셉트를 비틀거나, 믹스하면 되는데 말이다.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이 인기인데 문제는 시카 제품만 넘쳐난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국내사끼리 똑같은 성분으로 출혈 경쟁에 환차손으로 수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국내사끼리도 베끼는데 해외 기업이 복제하는 건 일도 아니다.
옆 회사 제품을 기웃거리는데 그치지 않고 서로 고자질이다. 식약처에 신고되는 화장품 광고 위반 사항 1만여 건의 99.9%는 경쟁사가 고발한다고 한다. 소비자 고발은 그야말로 ‘새 발의 피’다. 그렇다보니 소비자 반응이 왜곡된다. “어떻게 저 회사의 표현이 가능하냐. 우리가 똑같은 표현을 한 건 왜 처분을 받아야 하나?” 항의 아닌 민원 지옥에 식약처는 고개를 젓는다. 담당자들은 내색은 안하지만 업계의 더티 플레이에 왕 짜증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지방청 유선전화 등을 통한 고발성 광고 민원의 수는 연간 약 1만~1만2천여 건에 달한다. 고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위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한다면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또는 해당 품목 해당 광고 업무정지의 제재 처분을 내려달라”는 게 대부분이다. 고발자는 대부분 경쟁기업이다. 왜 그럴까?“라며 개탄한다.
경쟁사를 헐뜯으면서 내 물건을 하나 더 팔려다가 소비자로부터 ‘고만고만~’ ‘그게 그거’ ‘차별화가 안된다’ 등 중국 소비자들도 외면하는 K-뷰티 제품이 한국으로 전염될까 두렵다. 이 모두의 원인엔 ‘제조사 표기’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들은 ‘제조업자 표기 삭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요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데도 식약처는 업계 갈등을 이유로 꿈쩍도 안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중소 브랜드사들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신흥시장으로, 타사가 안 올 곳을 골라 시장개척에 나선다. 현지 여건에 대해 정보 공유나 제공을 절대 안한다. 동반 진출을 꿈꾸다간 ‘뒤통수 맞을까봐’ 피해의식이 먼저 작용한다.
그래서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들은 ‘제조업자 표기 삭제’를 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요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데도 식약처는 업계 갈등을 이유로 꿈쩍도 안한다. 그러다보니 일부 중소 브랜드사들은 한국 기업이 진출하지 않는 신흥시장으로, 타사가 안 올 곳을 골라 시장개척에 나선다. 현지 여건에 대해 정보 공유나 제공을 절대 안한다. 동반 진출을 꿈꾸다간 ‘뒤통수 맞을까봐’ 피해의식이 먼저 작용한다. 한국에선 알려지면 알려 질수록 견제와 시기를 받는다. 그래서 실적 뛰어난 기업들은 절대 미디어 노출을 꺼린다. 어떻게든 베낀 제품이 넘쳐나 시장이 흐려질까 겁나서다.
제조업자 표기가 왜 문제 되는지 모르겠다는 얼간이도 눈에 띈다. 로레알, 아모레퍼시픽 등이 왜 제조사를 노출 안하는지 모르나 보다. “어차피 알 텐데… 왜 그러냐”는 바보 같은 반응은 기가 찰 뿐이다. “니들이 시장을 알아~.” 물론 알 순 있다. 일본에선 제조사 이름을 알 순 있어도 접근조차 안된다. 노출도 안하지만 알 수도 없고, 굳이 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사업 비밀'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브랜드는 노출 자체를 계약 해제로 패널티를 매긴다. 왜 그럴까?
ODM이 잘 돼야 한다. 그렇다고 종합 ODM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차별화만이 소비자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 대기업 보다 실력 있는 중소 ODM이 건강한 생태계가 산업 발전에 유리하다. 전문화되고 제품 개발 이력이 충실한 중소 ODM이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그게 브랜드-제조사 간 ‘차별화’ 노력 및 R&D 촉진, 상생의 성장사다리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코스다.
반도체산업은 fabless - foundry로 구성된다. 설계 후 제조시스템이다. 화장품산업도 브랜드- 제조사 시스템이다. 마케팅 플레이어가 소비자 선택을 받아 주문한 상품을 과학적 근거가 뚜렷한 효능·효과로 전문 제조사가 생산하는 구조다. 이는 1992년부터 한 ODM이 내건 ‘1사 1포뮬라’ 구호다. "많이 팔아달라, 열심히 만들겠다"라는 게 한국 ODM의 출발이었다.
브랜드사의 상품 개발 경쟁이, indie 브랜드의 실험적이고 신박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전이(phase transition) 되면서 시장 파이가 확대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트랜디(trendy) K-뷰티가 환영받는 이유다.
이제 ‘한국 따라하기’는 해외 시장에선 공식이 됐다. 그렇다면 한국의 3만7천여 벌떼들의 전략 변화가 중요해졌다. 누가 달에 갈 것인가?(moon shot)의 전략적 접근이다. 그래서 ‘제조업자 표기’ 대신 제조사, 수입자. 포장업자(MoCRA) 중 하나 만이 RP가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선진+신흥시장에서 복제품(me too) 피해를 입지 않고 성장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인 화장품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해외 규제당국자에게도 먹힌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제조사 자율표시’를 3년째 요구하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데서 보듯, 화장품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켜야 한다. 바보 같은 ‘제조업자 표기’를 ‘여전히’ 주장할 때가 아니다. 일부 대기업 ODM의 욕심으로 중소 ODM과 브랜드사가 ‘갑질을 당하는’ 비즈니스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