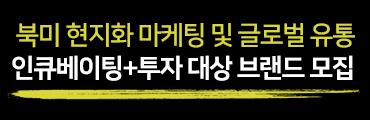팬데믹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변하지 않는’ 화장품산업의 원시적 생태계는 여전했다. 먼저 최근 줄줄이 열리는 전시회 마케팅은 식상하다. CI KOREA는 다양한 합동 전시회 성격이 있다고 해도 지난달 열린 코스모뷰티 등 전시회 현장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물론 오랜만에 북적거리고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생소한 업체도 눈에 띄며 기업의 부침도 새삼 눈에 들어왔다.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림짐작할 뿐. 어느 업계 대표자 말처럼 ”대박 났거나 사라졌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뼈 때리게 들려왔다.

최근 열린 ’2022 볼로냐 코스모프로프‘도 주최 측에 의하면 30%가 처음 참가하거나 재방문 업체다. 사실 북미나 유럽도 화장품 기업의 부침이 심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대면으로 해외 전시회에 참가했던 마케터들은 “애초 만나려고 했던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간 연락이 안됐던 바이어를 다시 만나면서 해외도 변화가 심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전했다.
메이저→인디, 인디↔인디로 또는 경쟁사↔유통사 간 이직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인디 브랜드의 신규 담당자를 추가로 알게 되는 수확도 있었다”라며 그는 씁쓸해했다. 혹 나도(?)라는 웃픈 현실은 그야말로 전 세계 화장품업계를 강타했다. 팬데믹[(pan(범(汎)+demic(民)] 단어 처럼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났음을 느낄 수 있다.
팬데믹 기간 우리나라의 화장품산업 매출은 소비재 중 꼴찌로 추락했다. 본지 추산에 의하면 최소한 지난 2년간(’20~‘21년) 10.5조원 이상 매출이 줄었다. 다른 소비재와 달리 화장품은 테스트나 리뷰, 경험 의존 성향이 있다 보니 온라인만의 매출도 한계라는 점이 증명됐다.(’21년 온라인 매출 –1.8%) 이렇듯 화장품산업은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성장에 제동에 걸렸다. 타 소비재와 다른 모습이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은 ‘21년 92억달러를 정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따이공과 면세점을 통해 숨겨진 매출이 코로나 2년 동안 쫙~ 빠지면서 드디어 수출실적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 결과 2022년 들어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K-뷰티 수출 100억달러’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1~4월 누적 수출 –17%, 중국 –30%) 중국 추락으로 예년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다.
대·중소기업 누구랄 것 없이 매출 감소, 줄줄이 적자, 직원 감원, 휴·폐업으로 업체간 안위를 물어보기 바쁘다. 실제 식약처가 “’20년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가 7조원 돌파”라고 자랑할 때 정작 생산실적은 15조원, –6.8%로 ’13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점은 애써 눈감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유독 ‘화장품 팔 곳’이 대거 사라졌다. 내수 침체와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명동 요지의 화장품 매장은 증발했다. 로드샵은 5468개(‘16)→2188개(‘21)로 60%가 줄었다. 온라인 해외직판도 ’21년 –31%를 기록했다. 편집숍의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올리브영은 매장 수익성을 이유로 1265개에서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 롭스와 랄라블라는 반토막 났고 접는 분위기다.
제주도에는 올리브영 매장이 단 두 곳이다. 그렇다 보니 100여 개 제주 화장품기업의 활로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이 바이어 매칭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지난 4월 ‘2022 볼로냐 코스모프로프’에는 70여 개국 3033곳, 참관객 26만 5천명이 몰렸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한국 기업은 500여 곳이 참가했으니 전체 6분의 1을 차지한다. 비용도 물경 200억대를 훌쩍 넘었으리라 추산된다.
한 업체 대표는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 전시회에 오는 바이어는 비행기 삯과 체류비를 부담하며 데려온다”라며 “가지 않고, 오게 만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전시회는 언제쯤 가능할지?”라고 말한다.

K-뷰티의 숙원사업이 ‘글로벌 수준의 국내 화장품 박람회 개최’다. 업계 건의사항이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 추진 여부조차 가물가물하다. K-뷰티의 글로벌 트렌드 선도와 한류와의 시너지 창출 등 명분은 충분한데 추진체가 없다.
코로나19라는 쓰나미가 덮치면서 화장품산업이 피폐해졌다. 총체적으로 화장품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그렇지만 기업의 ‘각자도생’이라는 원시적 생태계는 여전하다.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는 아직 화장품만큼은 ‘새 발의 피’다. 그런데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급감이 올해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내수 침체에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화장품산업의 경기 회복은 비관적이다.
때마침 규제 혁신으로 산업발전을 모색하는 ‘화장품 제도 선진화 협의체’가 발족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품질 체계 구축이 목표로 제도변화(사후관리체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다.
기자가 지난 시간의 업계 민낯을 소개하는 이유는 ‘각자도생’이라는 원시 행태에서 벗어나 ‘혁신’의 상생 생태계 구축만이 미래를 열어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K-뷰티가 단순 위탁생산기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하고, 화장품 특성을 살린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 발굴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