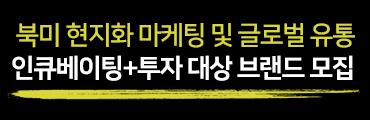#1 고객이다
매장은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기업들은 물건을 잘 만들고, 마케팅 활동에 집중한다. 그리고 고객의 선택만 기다린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딱 거기까지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물 한 방울이라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게 VMD(Visual Merchandiser)다. 마케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관리하는 전문가다. 디자이너+디스플레이어+스타일리스트를 합쳤다고 보면 된다. 보통 VMD는 직업을, VM은 업무를 지칭한다.
ICD(Imagination·Creativity·Design) 이태경 대표는 “매장은 고객과의 접점이다. VMD의 역할은 매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품이 잘 보이고 팔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VM이다. 예쁜 진열도 방법이지만 판매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과학과 수학을 입힌 디자인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소비재 가운데 화장품이 쉬우면서 어렵다. 고객 동선과 쇼퍼의 행동심리 등 쇼핑의 과학은 물론 수학 싸움이다. 제한된 공간에 한정된 수량의 화장품을 매대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열하는가, 테스터 화장품의 위치는? 등 함수를 푸는 문제다”라고 비유한다.

#2 과학이다
아마존고는 계산원과 서비스 응대가 없는 무인 인공지능 점포다. 빅데이터에 의한 디스플레이다. 또 최근 화장품 숍은 화장품 매장 입구에 바구니 두 개가 놓인 경우가 많다. '혼자 볼게요' 바구니를 들면 직원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지 않고, '도움이 필요해요' 바구니를 들면 다가와 쇼핑을 도와준다. 나홀로 쇼핑족을 겨냥한 매장 모습이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오롯이 제품만 접하게 된다. 소비자는 제품이 주는 메시지만 보고 읽고 테스터해서 구매에 이르게 된다. VM이 빛나는 순간이다.
이태경 대표는 “브랜드숍은 자사 상품만 있고 긍정적 경험을 중시한다. 하지만 올리브영·부츠·왓슨코리아 등 편집숍은 브랜드 간 전쟁터다. 자사 제품을 돋보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로드숍의 매장 한계는 왔고, 유통 경로 다양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반문한다. “이럴 때 소비자가 직접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파워풀한 수단이 VM”이라고 이 대표는 답한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철수도 잇따르고 있다. 대신 팝업스토어나 플래그숍이 늘고 있다. 최근 중국 항주 출장을 다녀온 이 대표는 “중국은 모바일 주문이 많다. 신흥 화장품 기업이나 후발 브랜드는 온라인 판매+오프라인 거점의 믹스 전략을 펴고 있다. 중국 대도시가 500개인데 대표적인 거점에 플래그숍을 개설, 홍보관 및 거점매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 VDM의 세계
이태경 대표는 홍익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1987년 아모레퍼시픽에 입사해 디자인 외길을 걸었다. 제품디자인부터 브랜드 로고·브로슈어·POP 등 인쇄물부터 시작해 디스플레이까지 총괄했다. 휴플레이스·아리따움·이니스프리·한율 기획 및 디자인작업을 총괄했다. 해외 브랜드숍의 미주·중국·홍콩·동남아의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의 매장 디자인작업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1세대 VMD로 현재 VMD협회 부회장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에 VMD가 도입된 게 2000년대 초다. 마케팅본부가 생기면서 BM이 생기고 개발부터 매장 오픈까지 원스톱 시스템이 생기면서 VMD도 멤버가 됐다. 이 대표는 “브랜드 론칭은 기업 사활과 연계된 만큼 체계적이어야 한다. 대표 의지와 임직원의 발상의 전환 등 깨어있는 조직이라야 VMD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품이 놓일 장소로 매대가 생기면 3차원 공간으로 확장된다. 고객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중점을 둔다면 VMD의 역할은 매출을 목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VM이 단순 디스플레이에 그치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마케터의 역할이 화장품의 실체를 만드는 제품 제작이라면 VMD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는 행위라고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VMD는 브랜딩 전체를 알아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 퇴사 후 그는 LG전자 디자인그룹 그룹장도 역임했다. “화장품과 스마트폰은 콤팩트 형태의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재다. 또 금형과 후가공 공정이 유사하고 그립감, 기능성 디자인 등에서 상호 응용이 가능하다. 전자회사들이 화장품 디자이너를 환영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후 중국 메이푸바오 디자인 컨설팅, 광저우 환야화장품 VMD총괄, 항주 플레야 화장품회사 VMD총괄 컨설팅 등을 수행했다.
ICD는 CX(Cosmetic experience: 코스메틱 브랜드 경험 솔루션)를 제안한다. 온·오프 환경의 브랜드 접점에서 브랜드 인지와 통합적 경험을 위한 전략적 브랜딩 기획과 디자인이 결합된 토탈 솔루션이다. △비주얼 디자인(고객 및 시장조사+트렌드 분석→비주얼 콘셉트→브랜드 리뉴얼→주기별 디자인+현장 세팅→피드백) △상품운용(분기별 상품 진열계획→신규 매장 오픈시 VM계획→상품 진열→피드백→매장 레이아웃 변경) △의사소통(브랜드 회의→월별 이슈 따른 소통과 공유→라운딩(VM 실행·관리)→시즌 품평)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진열-스타일-컬러-POP-조명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4 K-뷰티 명품이 탄생하려면?
글로벌 명품과 K-뷰티 수준은 겉으로는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졌다는데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양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태경 대표는 “그 차이점이 VM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 사전 제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작품성과 완성도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방영 직전까지 촬영하거나 쪽대본에 의존하기 일쑤다.
K-뷰티도 브랜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제작 때부터 VM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은 오프라인 입점 시 디스플레이에 한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기획 콘셉트를 살리기 어렵고 소비자 접점에서의 구매 유인에 소홀하기 쉽다.
이 대표는 “K-뷰티가 제품에만 올인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은 비용과 시간문제로 인해 질 좋은 제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그러다보니 △콘셉트 △캐릭터 △내용물 △외관을 별도로 생각한다는 것. 그는 “이미 제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정작 매출에 도움을 주는 VM 작업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프로세스 진행 전에 VMD의 조언을 가미한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VM은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짓는 순간 또는 마케팅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 요소가 VM이라는 것.

글로벌 VMD업체인 DIAM사는 사출기만 수백 대를 갖춘 디자인 공장이다. 로레알·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명품은 이 회사의 VM을 거쳐 탄생한다. 이태경 대표는 “VMD업계가 소규모 분화로 양적 팽창만 하다간 K-뷰티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없다”며 “K-뷰티가 로레알처럼 글로벌 명품을 탄생시키려면 VM이 임가공이 아닌 브랜딩 단계부터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VM은 화장품의 'from A to Z'”라고 말한다.
H&B숍이 유통시장 확대를 꾀하면서 브랜드사의 VM 관련 관심도 커지고 있다. VM의 ‘크고 넓게 보는 것, 작게 파고드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